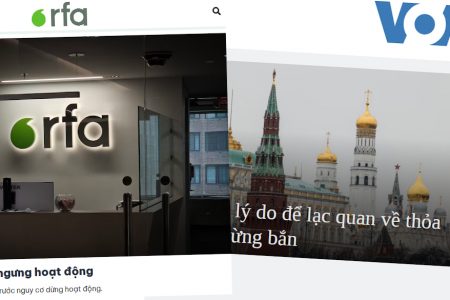쿠바는 2,000km가 넘는 해안선을 갖고 있고, 따뜻한 해류와 풍부한 산호초 덕분에 바닷가재, 생선, 새우, 게가 “넘쳐날 것”만 같다. 듣기만 해도 해산물 천국이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의 밥상에서 생선은 보기 드물다. 바다 한가운데 살면서도 “바다를 상상으로만 먹어야 하는” 쓰디쓴 역설이 펼쳐진다.

그 이유는 이곳에서 개인 어선이 생계 수단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탈출 수단”으로 여겨진다. 배를 가지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엔진을 달려면 마치 월경(越境) 허가를 받는 것처럼 어렵다. 연료는 “전략 자원”이 된다. 바다로 나갈 때는 보이지 않는 질문을 마주한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가, 자유를 찾으러 가는가? 그래서 어업 관리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사람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풀이 푸른지 양이 굶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양이 달아나지 않는 것이다.
해산물은 독점된다. 가치가 큰 품목은 외화를 벌기 위해 수출로 우선 배정되거나, 관광용 호텔로 들어간다. 평범한 주민들은 바닷가에 살아도 자유롭게 잡거나 사고팔 권리가 없다. “비공식 경로의 바닷가재”는 경제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다는 거기 있고, 물고기도 거기 있고, 사람도 거기 있다. 다만 바로 눈앞의 것에 손을 댈 권리만 빠져 있다.
계획경제는 여기에 또 한 겹의 냉소를 얹는다. “누가 생선을 먹는가”는 “누가 생선을 잡는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중요한가”로 결정된다. 낙후된 인프라는 오래된 배, 부족한 연료, 희귀한 부품, 취약한 냉장·냉동 유통망으로 이어진다.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종종 “길에서 죽는다.” 미국의 제재는 간접적 영향은 있지만, 쿠바인이 자기 집 앞바다에서 낚시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는다. 그들을 막는 것은 법으로 쓰인 두려움이다. 결말은 풍자화처럼 선명하다. 물고기는 바다 아래에 있고, 굶주림은 해안 위에 있다.